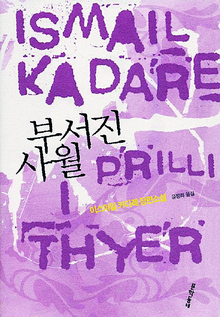
‘살인하지 말라.’ 이 절대적 계명이 인간의 살인 행위를 막을 수 없음은 이미 입증된 지 오래다. 웬만한 살인은 이야깃거리도 안 되는 세상에서, 이 계명은 그저 ‘분명 살인은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분열증적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지켜지지는 않지만)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살인’이라는 빈번한 행위를 낯설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고 죽음과 삶을 깔끔히 분리하듯이 살인자와 나를 구별하며 평온한 일상을 영위한다.
그런 점에서 <부서진 사월>은 복잡한 소설적 장치나 화려한 수사도 없이 우리의 마비된 의식을 내려찍는 육중한 도끼 같은 작품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대신 ‘반드시 살인하라’는 계명이 지배하는 세계, ‘오직 사람을 죽인 연후에야, 그리하여 이번에는 그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라야 비로소 삶이 이어지는’ 세계로 우리를 던져넣기 때문이다.
주인공 그조르그는 알바니아 고원 지대의 삶을 지배하는 관습법 카눈(kanun)에 따라서 죽은 형의 피를 회수한다. 그는 스무 번의 매복과 한 번의 실패 끝에 목표했던 상대를 소총으로 쏘아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이 살인은 우리가 기대하듯 복수의 마무리가 아니다. 70년 동안 양쪽 가문에서 마흔두 개의 무덤을 낳은 연쇄살인들을 잇는 또 다른 고리이며 그조르그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선포일 뿐이다. 카눈이 정한 대로 그는 상대방을 죽이는 순간, 똑같은 절차 -하루 동안의 베사(보호)와 30일간의 대베사, 매복과 경고, 시신을 똑바로 눕히고 총을 머리 가까이 두는 것까지- 에 따라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70년 전 낯선 나그네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리고 손님으로 환대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온 총에 맞아 하필이면 얼굴을 마을로 향한 채 길 위에서 쓰러진 그 순간부터 그조르그는 이미 ‘손님과 베사와 복수’라는 비극의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알바니아 출신의 작가 이스마일 카다레는 카눈의 수많은 법규 중에서도 ‘피의 회수’라는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항목을 통해 놀라운 살인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신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한 사람(물론 남자!)의 피는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의 피로 갚도록 규정한 카눈은 일견 야만적인 듯 보이지만, 무의미한 대량학살과 맹목적인 살인에 비하면 차라리 유의미하며 이성적이다. 상대방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그자크스(살인자)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니까. 살인의 이유도, 그 행위의 대가도 뼈에 사무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핏값을 치르는 데에는 나의 목숨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수가 행해질 때마다 한 사람의 핏값은 500그로슈라는 돈으로 정확히 환산돼 오로쉬 성에 사는 대공에게 피의 세금으로 바쳐져야만 한다. 이로써 카눈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 명예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은 마치 정교한 정미기 안에 들어간 낟알처럼 명예라는 껍질과 500그로슈라는 알맹이로 분리된다. 이 놀라운 죽음의 경제!
이 소설이야 물론 허구지만, 카눈은 엄연한 알바니아의 현실이다. 카다레가 조국의 관습인 명예살인을 매혹적일 만큼 장엄하게 그리다가도 다음과 같은 구절로 뒤통수를 치는 건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당신들의 책들, 당신들의 예술에서는 범죄의 냄새가 나오. 이 불행한 산악지방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는커녕 당신은 관객이 되어 그들의 죽음을 구경하고 재미있는 소재나 찾고 있소. 한 민족 전체를 피비린내 나는 연극을 공연하도록 몰아넣고는, 당신은 귀부인들과 함께 박스 좌석에서 그 연극을 관람하는 거요!”
이런, 우리가 뭘 어쩌겠는가. ‘그러니 살인하지 말랬잖아’라고 구시렁거릴밖에.
최인자 번역가
'도서출판여이연 > 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옥희 한겨레 21 서평 (0) | 2019.09.16 |
|---|---|
| 문영희샘, <<분노>> 서평입니다. (0) | 2019.09.05 |
| 한겨레21 월요 독서클럽 <어느 섬의 가능성> (0) | 2019.09.05 |
| 한겨레21 월요 독서클럽 <불안의 꽃> (0) | 2019.09.05 |
| <세계화의 하인들> 서평(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0) | 2019.09.04 |



